선비 1만명이 한양에 몰려가 상소를 읽으니 정조는 하염없이 울었다 [서평]
입력
수정
영남 선비들, 정조를 울리다
이상호 지음 푸른역사
260쪽 / 1만 6500원
1792년 영남 남인 선비들 1만여명
창덕궁 돈화문까지 가서 정조에 상소
"사도세자 죽음에 동참한 노론 세력 처단"
중앙 정계에서 배제된 선비들
만인소운동를 생생하게 묘사
"선비들의 집단 상소가 전체 협의와
엄격한 절차로 만들어져 공론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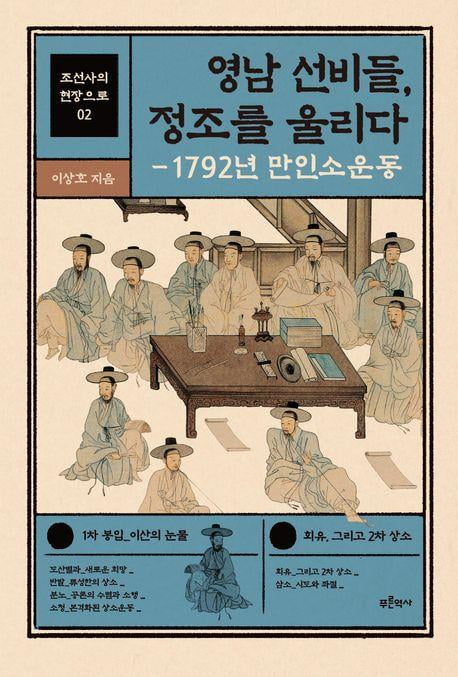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쓴 <영남 선비들, 정조를 울리다>는 그가 2021년 내놓은 ‘조선사의 현장으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1792년에 있었던 만인소운동을 다큐멘터리를 보듯 생생하게 재현했다. 책은 당시 영남 남인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려 고향을 떠나 한양을 거쳐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두 달을 담았다. 그 과정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천휘록> 속 만인소 상소 과정이 기록된 <임자소청일록>을 샅샅이 뒤졌다.
책은 류이좌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그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상소가 진행되는 과정과, 선비들이 한양으로 향하며 겪는 어려움과 논쟁, 다툼 등이 1인칭으로 소개된다. 저자가 류이좌의 시점을 빌려 사건을 전개하는 이유는 그가 <임자소청일록>을 서술한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영남 선비들은 중앙 정계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는 한(恨)을 앞세워 두 달만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상소를 올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부족한 자금, 반대 세력의 격렬한 방해 등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책은 전반에 걸쳐 류이좌가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을 떠나 상경하는 과정, 상소 예산을 짜는 과정과 상소를 위해 쓰이는 각종 비용, 집단 상소를 올릴 대표인 ‘소두’의 임명 절차 등을 자세히 전한다.
1792년에 이뤄진 만인소운동은 조선 역사 최초로 1만명 이상이 상소에 동참한 사건이었다. 겉으로는 왕 정조에게 “경종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행태를 보였던 류성한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린 듯 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참했고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던 자들(노론)을 정리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다.
즉 만인소운동은 한 세기 넘도록 중앙 정치에서 배제됐던 영남 사림 세력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왕 정조에게도 이 집단 상소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단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돈화문에 모인 선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당시 이들을 눈앞에 불러 직접 상소문을 읽게 했다. 내용을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사도세자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이들을 단죄하라는 선비들의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책은 그 모습 또한 영화를 보여주듯 류이좌의 시선을 빌려 생생하게 전달한다. 눈물을 흘리는 정조의 모습을 두고 “용안 위로 촛농을 닮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정조는 상소를 듣고도 곧바로 행동을 옮기는 대신 영남 선비들을 회유하는 길을 택했다. 영남 만인소운동의 한계였다. 하지만 영남만인소가 역사적으로 남긴 의미는 크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상소라는 문화는 매우 보편적이었지만, 이렇듯 대규모 인원이 직접 왕 앞에 상소를 올리는 국가는 조선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도 책에서 “선비들의 집단 상소가 자발적 참여, 전체 협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론’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소가 정치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