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만원, 40분 기다렸어요"…MZ 여성 열광한 男 정체 [현장+]
입력
수정
인스타그램 릴스 500만회 화제의 주인공
이종욱 선생 '이름 그림'에 시청역 대기 행렬

8일 오후 1시, 서울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 앞 인도는 평일 낮답지 않게 북적였다. 붓글씨와 전통 민화를 결합한 '이름 그림'을 받기 위해 밀레니엄+Z(MZ)세대부터 외국인, 중장년층까지 20여명이 넘는 이들이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
현장 분위기는 마치 작은 전시회를 연상케 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외국인, 감탄사를 연발하는 60대, 친구와 인증샷을 남기는 20대 여성, "예전에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라며 추억에 잠긴 중장년층까지, 모든 시선이 이종욱 선생(87)의 손끝에 집중해 있었다.
45년간 종로3가와 동대문 일대에서 그림을 그려온 그는 요즘 다시금 '핫한 작가'가 됐다. 관련 영상은 현재 조회수 583만회, 좋아요 21만 개, 공유 수 6만4000회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선생이 선보이는 '이름 그림'은 단순한 붓글씨가 아니다. 한글 또는 한자 이름을 정성껏 써 내려간 뒤, 그 주위에 조선시대 민화풍 그림을 더해 이름에 담긴 의미와 길상을 완성한다. 작품이 완성되면 선생은 "이 학은 오래 살라는 뜻이에요", "이건 부귀를 부르는 꽃입니다"처럼 짧지만 따뜻한 해석을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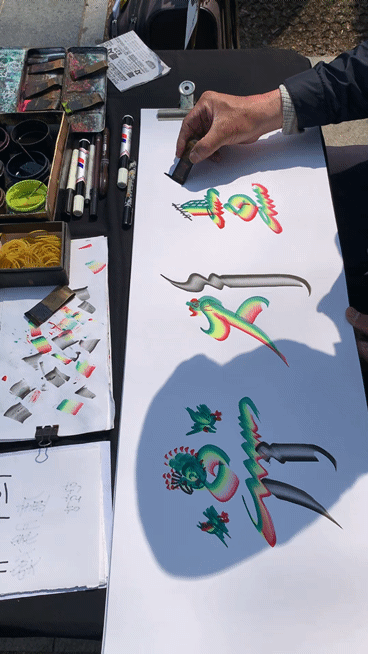
정갈한 붓글씨와 함께 피어난 민화풍 그림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서는 감동을 줬다. 붓끝에 담긴 손맛과 정성,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장인의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 선생은 기자에게 "이 학은 오래 살라는 뜻이다. 학처럼 날아서 아파트도 많이 사라고 아파트도 그렸다"고 말했다.
이후 2시간이 넘도록 선생은 단 한 번도 붓을 놓지 않았다. 그 사이 약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써줬고, 현장에는 여전히 긴 행렬이 줄지 않은 상태였다. "너무 늦게 오면 이름 못 받는다"는 속삭임이 들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한글 이름은 1만원, 한자 이름은 2만원이며 운영 시간은 대체로 월~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알려져 있다.
MZ도, 외국인도 "이건 진짜 소장해야 해"
인천에서 온 대학생 목정민(21) 씨는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고, 친구가 이름 그림을 잡지처럼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린 걸 보고 너무 감명받아 꼭 받고 싶었다"며 "오늘 서울에 약속이 있는 김에 일부러 들른 것"이라며 웃었다.
특이한 물건 수집이 취미라는 대구 출신 주부 강지민(32)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서울 사는 친구랑 약속 잡아서 올라왔다.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감성이 더 귀하고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욱 선생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하루에 40~50명은 기본으로 온다"며 "어제는 부산에서, 그전엔 대구에서도 왔다. 제주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도 많이 찾아온다"고 웃어 보였다.
그는 "이름을 써서 벽에 붙여두면 집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며 전통 붓글씨의 의미를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 전통이 '감성의 언어'가 되다
이런 '전통 민화' 열풍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다. 민화, 붓글씨, 그리고 이름 한 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따뜻함과 정성이, 시청역 앞 한 자리에 모인 이유다.챗GPT 등을 활용해 자신의 얼굴이나 반려동물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했던 이들이, 이제는 조선시대 민화풍으로 바꾸는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 아날로그 감성과 전통적 정서가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는 것이다.
전문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감성적 안정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욕구가 전통과 연결되며 의미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콘텐츠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조선시대 민화풍 글씨를 쓰거나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방식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매우 독특하게 느껴진다"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이질적인 조화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간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전통을 잘 다루지 않는 지금의 문화 환경 속에서, SNS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전통 콘텐츠가 '희귀템'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남들과 똑같은 콘텐츠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통이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