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통상임금? 약정 통상임금?
입력
수정
한경 CHO Insight
태광노무법인의 'e노무세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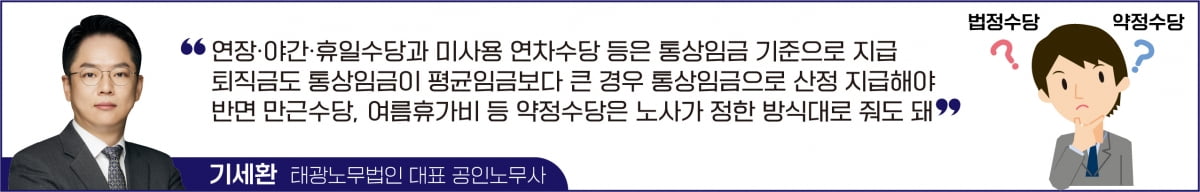
요체는 이렇다.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연장,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이러한 법률에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의 계산에 따른 상여금 등의 범위나 기준을 법적해석에 따라야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다양한 약정 수당들의 경우에는 문언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두었더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법적 해석기준에 따라서 계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최소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배됨이 없다는 점과 노사합의 시점에서의 지급하기로 한 그 결정배경과 이유를 충실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대법원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서 확인되어온 나름의 확립된 법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노사가 약정으로 정한 여러 수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변화에도 약정의 수당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불측의 인건비 증가도 줄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통상임금 산정방식 그 자체에 있어 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1.5배의 가산율을 2배로 정하고 있다던가, 혹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에 배수율을 적용하거나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면서 20시간의 시간분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다. 이 역시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노사합의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약정의 통상임금 계산방식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정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기존 수당의 금액이 통상임금 변화를 반영한 법적계산 방식의 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차액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기서 일부 근로자들은 법적기준을 상회하게 설정한 계산방식을 기초로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는 소위 유리한 조건을 취사선택하여 여전히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유리한 조건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법리를 통해 약정의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에 대한 유효성을 명확히 확인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이 점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정과 약정의 방식이 구분된 다양한 수당을 살펴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에 있어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을 모두 포함해 계산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법령 기준에 의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통상임금 역시 법적해석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반면, 토요일 휴무일과 같은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약정의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계산 지급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유급의 병가나 휴직급여, 그리고 만근수당이나 하기수당(여름휴가비)과 같은 전형적인 약정의 유급수당 역시 노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충분하다.
| 임금유형·형태 | 지급임금 기준 | 비 고 | |||
| 법정통상임금 | 약정통상임금 (또는 기본급) | ||||
| 1 | 법정 연장·야간·휴일수당 | ○ | ✕ | 대법원 2024.12.19. 2020다247190(전합) | |
| 2 | 연차미사용수당 | ○ | ✕ | 대법원 2019.03.28. 2016다13314 | |
| 3 | 근로자의날(5월1일) | ○ | ✕ | 대법원 2012.7.26. 2011다6113 | |
| 4 | 퇴직금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 대법원 2019.4.23. 2016다37167 | |
| 5 | 15일휴일보전수당, 국공휴일보전수당 | ○ | ✕ | 창원지법 2022.4.19. 2020가단112525 | |
| 6 | 약정 휴일수당 | - | ○ | 대법원 2012.11.29. 2010다109107 | |
| 7 | 약정 병가/휴직급여(수당) | - | ○ | 대법원 2020.08.20. 2019다14110 | |
| 8 | 만근수당·하기수당 | - | ○ | 대법원 2019.2.14. 2015다78376 | |
| 9 | 생리휴가수당 | - | ○ | 수원지법 2022.06.09. 2019가합2561 | |
| 10 | 주휴수당 | 월급제(1) | ✕ | ✕ | 대법원 2024.02.08. 2018다206899 |
| 시급·일급제 | ○ | ✕ | 대법원 2025.01.23. 2019다204876 | ||
유의할 점은 주휴수당이다. 최근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면,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임금 외에 다양한 수당에도 주휴수당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의 변화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주휴수당 분이 발생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시급·일급제의 경우에는 기본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에서 통상임금의 변화시 그에 상응한 추가 주휴수당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주휴수당의 차액분을 청구한다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소송경과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통상임금의 변화로 일부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30~40%까지 오른다고 하니 통상임금의 해석에 있어서도 꼼꼼한 파악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통상임금의 속내까지 살펴, 법정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과 약정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명확한 산정방식과 기준에 따라 임금관리를 실현해 가야할 때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